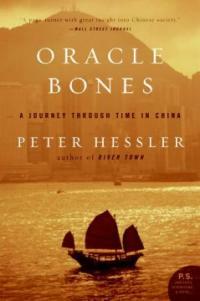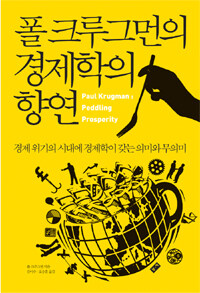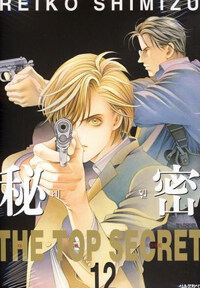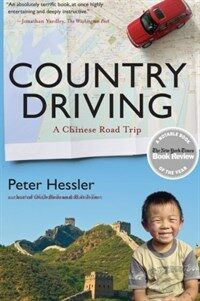 |
Country Driving: A Chinese Road Trip (Paperback) -  Hessler, Peter/Perennial |
피터 헤슬러의 중국3부작 중 마지막 권을 읽고 있다. 너무나 아쉽게도 더는 없다.
아직 다 읽진 않았고, 1/3쯤 읽었는데,
세번째 컨트리 드라이빙에서 저자는 만리장성을 따라 중국도로를 운전하며 여행한 경험담을 다루고 있다.
만리장성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만리장성의 역사, 그 지역의 생활상을 궁금해하고 기술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오지라퍼 저자께서는 여기에 그치지를 않는다.
오라클 본즈에서도 참 희한한 것을 파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갑골문자 발굴 현장에서, 수십년전에 죽은 고고학자의 생애를 캐고 있었으니...)
이번엔 아예,
중국에서 길을 물을 때 지도를 꺼내드는 순간 난리가 나므로 절대 꺼내면 안되더라, 라는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하여,
기원전 2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를 만들었던 민족이 왜 이렇게 지도에 무지한가를 거쳐,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국영회사에 인터뷰를 간다거나,
운전하고 있는 렌트카에서 비롯하여 중국 자체 자동차 회사의 테스트 드라이빙에 통역자로 참석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사고의 흐름을 충실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표본이다.
(아무말 대잔치처럼 사고의 흐름을 입밖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짓 대잔치려나.)
P 266.
Wei Ziqi가 주차된 차를 옮기다가, 앞 범퍼를 다 찢은 렌트카를 돌려주려 감.
Back in Beijing, when Mr. Wang saw the car, his eyes widened.
"Waah!" he said "How did you do that?"
"I didn't", I said. "I let somebody else drive. I'm sorry, I shouldn't have done that." I began to descrive Wei Ziqi's lack of experience with cars that had front ends, and Mr. Wand looked confused' the more I expanded on this topic, the blanker his expression became. I realized that if I continued with all the relevant details-the Liberation trucks, the Shunyi driving school regulations about starting in second gear, the Jetta-sised Great Wall in Sancha village-Mr. Wang's head would probably explode. At last I abandoned the story and offered to pay for the bumper.
"Mei wenti!" Mr. Wand said, smiling. "No problem! We have insurance! You just need to write an accident report. Do you have your chop?"
In China, the chop is an official stamp, registered to a company. My formal registration was in the name of the New Yorker magazin's Beijing office, although in fact this operation consisted of nothing more than me and a pile of paperwork. I almost never used the chop, and I told Mr. Wang that it was at home.
"Mei wenti!" he said. "Just bring it next time." In the rental car office, he opened a drawer and pulled out a stack of papers. Each was blank except for a red stamp. Mr. Wand rifled through the pile, selected one, and laid it in front of me. The shop read: "U.S.-China Tractor Association."
"What's this?" I said.
"It doesn't matter," he said. "They had an accident, but they didn't have their chop, so they used somebody else's. Then they brought this page to replac eit. Now you can write your report on their page, and next time bring a piece of paper with your chop, so the next person can use it. Understand?"
I didn't-he had to explain this arrangement three times. Finally it dawned on me that the wrecked bumper, which hadn't been my fault, and in a sense had not been Wei Ziqi's fault either, because of the unexpected front end, would now be blamed on the U.S-China Tractor Association.
너무나 아쉽게 3부작을 다 읽어치웠다.
본래의 주제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두 개 있었다.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마을에는 먹고 살만한 일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새롭게 수익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월드워크래프트의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이템을 파밍해서 파는 것.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그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듯한 청년들이 진짜로 등장하는 것을 읽는 것은 꽤나 이상한 기분이었다. 결국 블리자드는 이런 식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고, 번창하던 사업을 접게 된 마을 청년들은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해안가 도시들로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장성 정부에서 예술인 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난 미술 사업가들의 이야기인데, 공부를 못해서 일반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던 한 아가씨는 대안으로 미술학교에 가서 배운 기술로, 어딘지도 모르는 유럽의 풍경들을 그려 유럽의 화상들에게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있는 게 무슨 빌딩인지 아냐고 묻자, 탑이 아니냐고 되묻는 화가사업가에게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미국 소도시의 풍경에 포함된 간판의 철자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면서 저자는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다. 이 화가사업가들이 그린 유럽의 풍경들은 유럽 곳곳의 기념품 가게에서 관광객 - 아마도 많은 비율로 중국인 - 들에게 팔릴 것이고, 그들이 그린 미국의 풍경은 어느 호텔 방을 장식하게 되겠지만, 아무도 이들이 그린 그림임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일로써만 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순수히 호의로 그려준 저자의 고향 집 풍경은 그들이 돈을 위해 그리지 않은 거의 유일한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서명을 한 유일한 그림이기도 했다.
헤슬러가 다른 좋은 글들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냈으면 좋겠다.